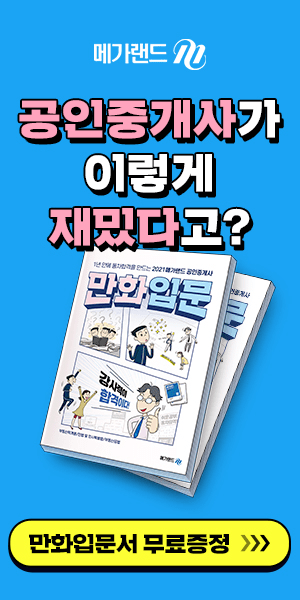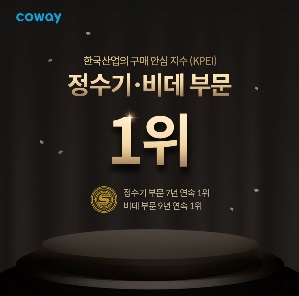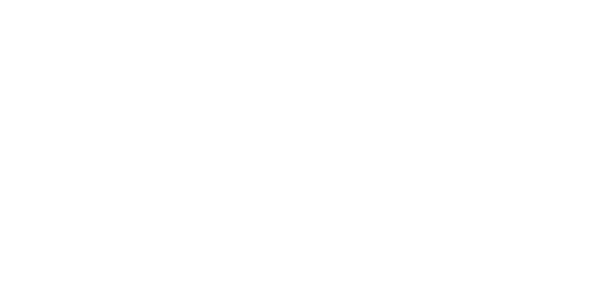경제
억대 연봉 받으면서 '주 4.5일' 달라 파업?…동료마저 외면한 '귀족 노조'의 민낯
기사입력 2025-09-26 12:51 주요 시중은행원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 등을 내걸고 26일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이는 사실상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말았다. 노조 내부에서조차 파업의 명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고, 전국의 모든 은행 영업점은 아무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은행별 파업 참여 인원은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수십 명 수준에 머물렀으며,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조합원 투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아예 파업에 불참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금융노조 위원장이 소속된 IBK기업은행에서만 1,400여 명이 참여해 그나마 체면을 차렸지만, 이마저도 전체 영업점 운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처럼 총파업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설득력 약한 명분이 꼽힌다. 노조는 임금 3.9% 인상, 정년 연장과 함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을 30분 늘리는 대신 금요일은 오전에만 근무하는 '주 4.5일제' 도입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조합원들 사이에서조차 "파업까지 벌여 쟁취할 사안인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주요 시중은행원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 등을 내걸고 26일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이는 사실상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말았다. 노조 내부에서조차 파업의 명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고, 전국의 모든 은행 영업점은 아무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은행별 파업 참여 인원은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수십 명 수준에 머물렀으며,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조합원 투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아예 파업에 불참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금융노조 위원장이 소속된 IBK기업은행에서만 1,400여 명이 참여해 그나마 체면을 차렸지만, 이마저도 전체 영업점 운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처럼 총파업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설득력 약한 명분이 꼽힌다. 노조는 임금 3.9% 인상, 정년 연장과 함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을 30분 늘리는 대신 금요일은 오전에만 근무하는 '주 4.5일제' 도입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조합원들 사이에서조차 "파업까지 벌여 쟁취할 사안인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이미 '억대 연봉'을 받는 귀족 노조라는 비판적 여론이 팽배한 상황도 파업의 동력을 잃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가 모두 1억 1천만 원을 훌쩍 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근무시간 단축 요구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금융이 확산하며 지난 6년간 은행 점포 1,200여 곳이 사라진 상황에서, 영업시간마저 줄일 경우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의 진짜 배경에 현 집행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3년 주기로 돌아오는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철마다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드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으며, 올해 역시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세 과시를 위해 무리하게 파업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내부 동력과 국민적 지지, 시대적 명분까지 모두 잃은 이번 파업은 선거용 '보여주기식 투쟁'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